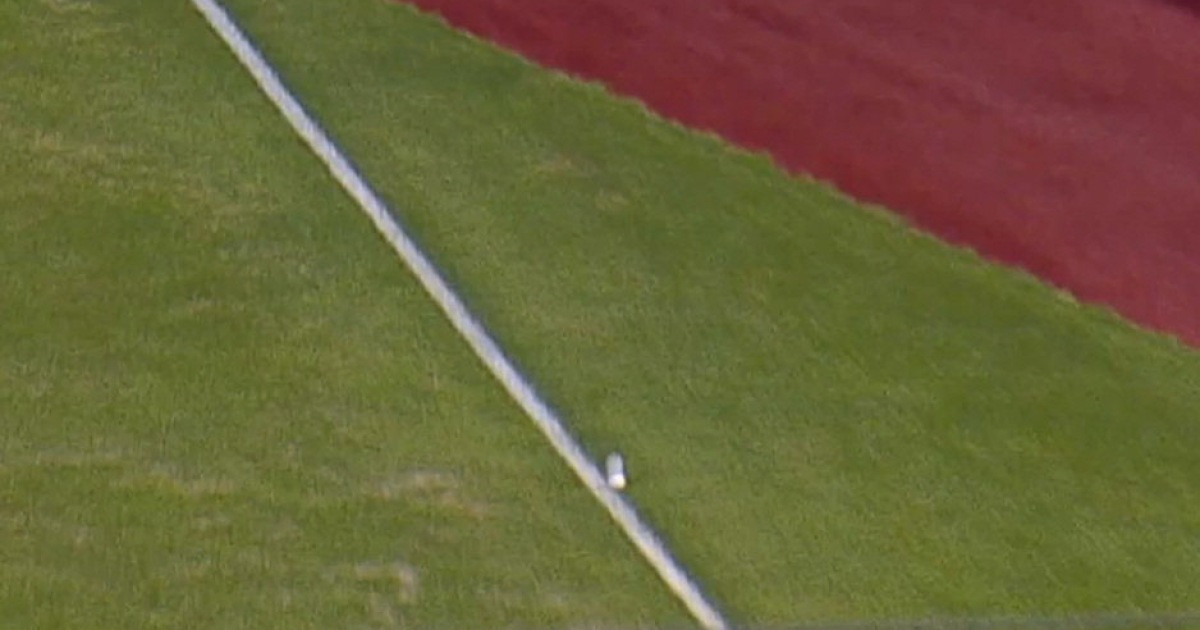시즌 종료까지 23경기가 남았고 두산의 9위는 확정이다.
막판 7연승으로 팬들의 마음을 달래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5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분명 있었지만 결국 가능성에 불과했다.
KT와의 3연전 스윕패가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 3연전의 모습이 두산의 현재 모습이다.
우린 가을 야구를 논할조차 그럴 능력도 안된다는 것이다.
남은 경기에서도 예전 같은 두산다운 야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년 시즌 역시 크게 기대가 가지 않는다.
조성환의 야구는 로이스터식 자율야구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로이스터의 시도가 당시 롯데 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가을야구 무대에서 김경문의 두산 야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롯데 팬들에겐 성공이라 불릴 수 있겠지만 두산 팬들에겐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야구였다.
그런 한계를 답습하는 듯한 조성환의 야구가 못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자율야구는 KBO에서 우승을 만들지 못했다.
리그 패권은 돈과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준비된 감독들이 차지했다.
감독은 주어진 자원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부상과 부진은 어느 팀에나 있고, 완벽한 팀 구성으로 한 시즌을 치르는 경우는 없다.
결국 감독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두산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
조성환 대행이 6월 초부터 팀을 맡고 지금까지 서바이벌하듯 버티는 건
결국 자신만의 야구가 없다는 증거다.
9월에 시도할 실험을 이미 여름부터 끌고 왔고,
이해는 되지만 스포츠는 결국 이겨야 한다.
젊은 선수들이 내년에 성장할 거라 믿고 싶지만,
이 전력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강력한 외국인 투수 두 명과 우즈나 에반스 같은 우타 거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독 선임이다. 팀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다.
조성환에게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 좋은 감독, 언론에 말 잘하는 감독은 필요 없다.
그건 프런트나 방송 마이크를 잡을 사람이 할 일이다.
냉정하게 말해 이승엽과 조성환 체제의 성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승엽이 2년 반 동안 팀을 망쳐놨기 때문에 조성환이 나아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다.
신선함과 파격은 있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쉽다.
결국 성적이 감독의 성적이다.
막판 7연승도 고추가루 팀으로서의 반짝이었을 뿐,
상위권 팀에겐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9월의 확대 엔트리 속 남은 경기들은 실험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뿐이다.
6년 주기설이 있다.
팀이 6년간 우승을 못했다는 건 구단주, 프런트, 감독, 선수 모두의 책임이다.
내년이면 벌써 7년째다.
- 선택됨